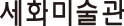메인 컨텐츠

- 주최선화예술문화재단
- 전시장소태광그룹 일주&선화갤러리
- 관람관람/전시안내 참조
찾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작품
“전시장 앞에 특이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공사 현장처럼 벽도 부분부분 무너져 있고, 주변에 공구들도 널려 있고요.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더니 헬멧을 쓴 사람이 제게 다가와서 비키라고 하더군요. 작품이 아니라 정말 공사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조각 공부를 해왔는데 작품도 구별 못하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 이런 재미있는 상황을 내 작품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산 작가 인터뷰 내용 中)
작가 허산은 얼핏 보면 평범한 일상 공간처럼 보이는 작품을 선보인다. 2011년 영국에서 선보인 작품 <경사각>은 그저 텅 빈 공간에 바닥이 기울어져 있을 뿐이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지 벽 주변에 부서진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 그 자체가 작품이었다. 이전에 작가가 작품으로 착각했던 갤러리 공사 현장에서의 경험을 고스란히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작가가 경험한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공사현장 이였지만, 작가가 선사하는 공간은 일부러 만들고 연출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간 벽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공구를 놓은 <벽에 난 구멍>, 기둥 속에서 유물이 발굴된 것처럼 도자기가 반쯤 드러나 있는 작품 <부서진 기둥> 등 그의 작품은 숨은그림 찾기처럼 일상 속에서 예술을 찾게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술인 것일까. 일상 공간, 사물과 작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모더니즘 이전에는 누구나 예술 작품을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림, 조각 등 작가가 빚어낸 ‘아름다움의 결정체’는 어디에 있어도 작품의 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남성용 소변기를 뒤집어 놓고 <샘>이란 제목을 붙인 뒤샹의 작품을 비롯하여 개념미술이 등장함으로써 무엇을 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예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졌다. 허산은 이 경계를 일상 공간으로 확대하여 예술에 대한 의미를 다채롭게 표현한다.
허산의 작품은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하는 ‘찾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작품’이다. 눈 앞에 있어도 작품인 줄 모르다가 이것이 작품이라고 깨닫는 순간 주변이 달리 보인다. 일상이 특별해 지는 찰나, 그 변화의 지점을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작품과 작품을 둘러싼 공간, 그리고 공간과 관람자, 작가의 의도 등이 점점 확대되고 맞물려 가면서 관람자는 다양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부서진 벽과 구멍 난 기둥, 무너진 잔해와 파편들이 어떻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아름다움과 추함은 무엇인지, 벽 속에 있는 물건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인지 작가의 기억인지, 그렇다면 이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작품에 대한 궁금증은 공간과 작가에게로 확대된다.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던 공간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면서 관람자는 몸을 움직여 이곳 저곳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허산은 신작 '정원(garden)'( *가제>을 선보인다. 이전 작품에서는 관람자들이 벽, 기둥에 뚫린 구멍 사이로 보이던 도자기 등을 통해 현실과 다른 세계를 엿보고 상상했다면 <정원>에서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일상 공간에서 작품을 만나고, 작품 속에 들어가 자연을 만나는 형태이지만 결국 이 자연도 작가가 만들어낸 인공물이므로 ‘작품’이 되는 것이다. 마치 인형 속에 인형이 들어있는 마트료시카처럼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이 반복되어 한 전시 공간 안에 펼쳐진다.
예술은 인공이다. 자연과 달리 인간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든 산물이다. 여기에 하나 더, 칸트는 ‘독창성과 미적 이념이야말로 순수한 예술작품과 다른 인공물을 구별하는 요소이며 미적 형식주의가 벌려놓은 예술과 삶의 간극을 좁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보았다. 허산의 작품을 통해 예술작품과 다른 인공물을 구별하는, 그러면서도 형식주의의 틀을 벗어나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예술을 ‘알아차리는 순간’을 만날 수 있다.